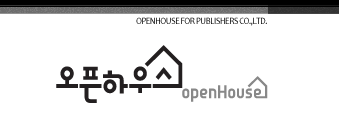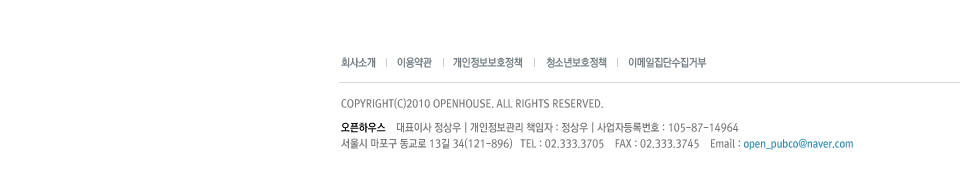|
|
|
| HOME > ЕЖРкФкГЪ > О№ЗаРкЗс |
|
| |
|
|
|
| |
|
 |
АјСіПЕРЧ СіИЎЛъ ЧрКЙЧаБГ[ЧбАмЗЙНХЙЎ 2010.12.03] |
|
|
|
|
|
|
|
|
|
|
|
| |
ЁЎВЧСі РлАЁЁЏРЧ СіИЎЛъ ЙўДдЕщ ДыАјАГ
ЁЎВЧСі РлАЁЁЏАЁ ПГКЛ СіИЎЛъ ЛчЖїЕщРЧ РЬОпБт. БзГЩ ПГКЛ Ад ОЦДЯДй. ЙЋСіЙЋСіЧЯАд СњХѕЧбДй. Бз ПЉРЏПЭ ЧрКЙРЛ ХНЧбДй. ЁЎСіИЎЛъЧрКЙЧаБГЁЏРЧ СжРЮРК РлАЁ АјСіПЕРЬ ОЦДЯДй. СіИЎЛъПЁ БъЕч ЙіЕщФЁ НУРЮРК АјОО МКРЛ АЁСј РЬ МвМГАЁИІ ЁАВЧСіОп~ЁБ ЧЯАэ КЮИЅДй. БзЗЁМБАЁ. НКНКЗЮЕЕ ЁЎВЧСі РлАЁЁЏЖѕДй.
ЛљРЬ ГЊМРЯБю. ВЧСі РлАЁДТ РлНЩЧЯАэ ЁАМПяРК БэРК АмПяЁБРЮЕЅ ЁАШёЕ№Шђ ИХШВЩРЬ ЙйЖїПЁ ГЊКЮГЂДТЁБ ЙіЕщФЁ НУРЮ ЙкГВСиРЧ СіИЎЛъ С§РЛ ЛЗСњГЊАд УЃОЦАЃДй. ЁАБз Йу ПьИЎАЁ ИЖНУДТ МвСжРм РЇЗЮ ИХШВЩРЬ КаКаЧпАэ ИХШ ЧтБтДТ КНЙйЖїРЛ ХИАэ ФєРлРл ФєРлРл ЛяЙкРкЗЮ ПьИЎ СжРЇИІ АЈНеДйЁБДј Бз С§ПЁМ Бз НУРЮРЧ РЮЛ§РЬЗТАњ ПфЛчРЬ ЛчДТ И№ОчЛѕИІ КИЕЕЧЯДРЖѓ ЙйЛкДй.
<АјСіПЕРЧ СіИЎЛъ ЧрКЙЧаБГ>ДТ ЁАСіИЎЛъРЛ ЕюПЁ СіАэ МЖСјАРЛ ГЛДйКИИч ПЫБтСОБт ЛьАэ РжДТЁБ ВЧСі РлАЁРЧ ЙўЕщ, А№ ЙіЕщФЁ НУРЮАњ ФЃБИЕщРЬ ОюПьЗЏСЎ ЛчДТ ЁЎСіИЎЛъ ЧрКЙЧаБГЁЏРЧ РЯЛѓ РЬОпБтДй. ЙіЕщФЁРЧ ЁЎРЬПєЕПГзЁЏ СіИЎЛъ ВРДыБт ЧЧОЦЛъЙцПЁ ЛчДТ ЁЎГЋРхКвРдЁЏ РЬПјБд НУРЮАњ БзРЧ ОООяОООяЧб ОЦГЛ АэОЫЧЧПЅ(ЭдRPM) ПЉЛч. ГЋРхКвРд НУРЮРЛ Л§ИэЦђШ ПюЕППЁ ГЊМАд ЧЯАэ РкНФУГЗГ ОЦВИСи МіАц НКДд, ЙіЕщФЁРЧ ФЃБИЗЮ ПЌКР 200ИИПј СжТїАќИЎПфПјРЬИч РЬПєЕщРЧ ОЦЧТ МгГЛИІ РпЕЕ ЕщОюСжДТ ЁЎГЛКёЕЕЁЏ УжЕЕЛч, МвНЫРћ ППЉДќПЁ ЧиЙцРЛ ИТОЦ БИЗЪАцТћМРЧ РЯКЛ АцТћРЛ Дй ТбОЦГТДйДТ 40Гт СіИЎЛъ СіХДРЬ ЧдХТНФОО. АЁПРИЎТђ ОШСжИІ ИРГЊАд ГЛГѕОвДј БИЗЪРЧ ОЦСжИгДЯПЭ ОЧОчИЗАЩИЎПЭ ЧЯЕПРЧ БЭГѓ КЮКЮ.
РЬЕщРЬ СіИЎЛъЧрКЙЧаБГРЧ ЁЎГЫГЫЧбЁЏ СжРЮАјЕщРЬДй. ГЪЙЋ ПЙЛЕМ ИдБтАЁ ОЦБюПя СЄЕЕЗЮ ЁАВЩИ№ОчРИЗЮ ДчБйРЛ Б№Аэ АЋРИЗЮ КгАд ЙАЕщРЮЁБ ЕПФЁЙЬИІ ДуБл Сй ОЦДТ ГыУбАЂ ЙіЕщФЁ НУРЮПЁАе ЛчЖїРЬ И№РЮДй. МњРдГз, ЙнТљРдГз ЧбЛчФк АХР§ЧиЕЕ АЎДй ГѕАэ АЁДТ ПЉРЮГзЕщЛгРЬЗЊ. ГВГр ИЗЗа, АЂСіПЁМ УЃОЦПРДТ ХыПЁ Бз С§ ОеРК БцРЬ ИЗШљДмДй. ПыЧЯДйДТ СЁРяРЬАЁ ЧбДЋПЁ ЁЎПьИЎ АшРЧ ХЋ ОюИЅ ЕЧНЧ КаЁЏРИЗЮ ОЫОЦКУДйДТ ЙіЕщФЁ НУРЮРК МЎ До ГЛГЛ БЭНХРЬ УЃОЦПЭЕЕ ЧдВВ Бз Бф ЙуРЛ РпЕЕ СіГТРИЕЧ ЁЎЕЖЧб ЛчЖїЕщЁЏРК ТќРИЗЮ ЙЋМЗДмДй. С§ Ое АГПяПЁ НУРЮРЬ ХАПьДј ЙіЕщФЁЕщРЛ РќБтУцАнБтЗЮ СзПЉЙіИА ЕЂФЁ ХЋ ГВРкЕщЧбХз ХЋ ПыБтИІ ГЛОю Д§КГДйАЁ ОѓБМПЁ ЧЧИлРЬ ЕщОњДй.
УЪЕю 5ЧаГт ЖЇ ЁЎПРЗЃИИПЁ ПРНХ ЛяУЬ, АЃУИРЮАЁ ДйНУ КИРкЁЏЖѓДТ ЙнАјЧЅОюЗЮ ХЋ ЛѓРЛ ЙоРК ОЦРЬДТ РЧБтОчОч С§РИЗЮ ЖйОюПдДй. Бз ЛѓРхРЛ КЛ ОюИгДЯДТ ММЛѓПЁ ХТОюГЊ АЁРх ННЧТ ОѓБМРЛ КИРЮДй. ОЦРЬРЧ ОЦЙіСіДТ ГЋПРЕШ ЛЁФЁЛъРИЗЮ АэЧтРИЗЮ ЕЙОЦПРСі ИјЧЯАэ ХКБЄПЁ ЕщОюАЁ РЬИЇРЛ ЙйВйАэ СзОюАЌДй. ГЋРхКвРд РЬПјБд НУРЮРЧ РЏГтРЬДй. СїРхПЁМ ЧиАэЕЧАэ ОЦГЛПЭЕЕ РЬКАЧЯПЉ ШЅРкАЁ ЕШ БзАЁ СіИЎЛъПЁ ЕщОюПТ РЬРЏДТ ОЦЙіСіПДДй.
РЬИэЙк СЄКЮ ЕщОю Л§Иэ, ЦђШ, ШЏАцПюЕППЁ ОеРхМДТ НКДдАњ НХКЮДдЕщПЁ ДыЧб ДыРРРЬ АЂЙкЧиСГДТЕЅ, ЧбЙјРК И№УГПЁМ ДЉАЁ УЃОЦПЭМБ ЁАЕЮЗчЕЮЗч ИіСЖНЩЧЯНЪМю. ПЉРк ЙЎСІИч РЬЗБ АХ РњШёАЁ СЖЛч ЕщОюАЌНРДЯДйЁБЖѓАэ РИИЇРхРЛ ГѕОвДй. Чб НХКЮДд(ШФРЯ НХКЮДдРЬ ОЦДб ИэСј НКДдРИЗЮ ЙрЧєСГДй)РЬ АнГыЧЯПДДй. ЁАПЉРк ЙЎСІ? МГЛч БзЗБ РЯРЬ РжДйАэ ФЁРк. ГЪШёДТ ИЖДЉЖѓЧЯАэ ГЏИЖДй ЧЯИщМ ШЄНУ ПЉБт АшНХ КаЕщРЬ ЦђЛ§ ЧбЕЮ Йј Чб АЩ АЩАэГбОюСјДйАэ? РЬ ФЁЛчЧЯАэ ГЊЛл Г№Ещ!ЁБ БзЗЏРк АХСўРЛ ТќСі ИјЧЯДТ ГЋРхКвРд НУРЮРЬ СЄЗаСїЧЪЧпДй. ЁАНХКЮДд, ОЦЙЋИЎ БзЗЁЕЕ ЦВИА ИЛ ЧЯНУИщ ОШЕЫДЯДй. АсШЅЧпДйАэ ГЏИЖДй ЧЯДТ АХ ОЦДЯПЁПф.ЁБ ЛчЖїЕщРЬ ПєРНКИИІ ХЭЖпИЎДТЕЅ НХКЮДдАњ НКДдЕщРК СјСіЧЯАд ГЋРхКвРд НУРЮПЁАд ЙАОњДй. ЁАСЄИЛ?ЁБ
РЬЕщРЬ СіИЎЛъЧрКЙЧаБГРЧ ЁЎЛчЖћНКЗБЁЏ СжРЮАјЕщРЬДй. РЬЕщРЧ РЬОпБтИІ ЙЬСжОЫАэСжОЫ МгЛшРЬАэ ЧдВВ ОюПьЗЏСЎ УыЧЯДТ ЁЎВЧСі РлАЁЁЏРЧ ЧрХТ ПЊНУ ЛчЖћНКЗДБтИИ ЧбЕЅ, ЁЎСіИЎЛъ ЧрКЙЧаБГЁЏДТ БзЗЏДЯБю РкПЌРЧ МјИЎПЁ ИіРЛ ГЛИУАм Л§ИэРЛ ЛчЖћЧЯАэ ЦђШИІ РЇЧи НЮПьАэ МвЙкЧб ЛюПЁ ХНДаЧЯДТ ЛчЖїЕщРЬ ЛчДТ ЕПГзЕщРЬАкДй. Бз ЛъРЧ ЧАОШПЁМ 50ИИПјРЬИщ 1ГтРЛ СіГНДйДТ РкЙпРћ АЁГРЛ МБХУЧЯПЉ ЛьОЦАЁДТ РЬОпБтРЬАкДй.
Бз ЛюРЛ СњХѕЧЯИщМЕЕ МПяРЛ ЖАГЊСі ИјЧЯАэ Бз ПЉРЏИІ ХНЧЯИщМЕЕ АЁГРЛ НКНКЗЮ ХУЧЯСі ИјЧЯДТ ВЧСі РлАЁДТ ЁЎПьИЎЕщ ЕЕНУ МЙЮЁЏРЧ И№НРРЛ ДрОвДй. Бз ЧрКЙЧаБГДТ РЬИЎ ПЭМ ААРЬ ГюРкАэ РкВйИИ РЏШЄЧЯСіИИ БзЗЁЕЕ РкСж УЃОЦАЁСіДТ ИЛ РЯРЬДй. ГЪЙЋ КЯРћРЬИщ СіИЎЛъ ЧрКЙЕПГз ЛчЖїЕщРЬ ННЦлСњСіЕЕ И№ИЃДЯ ИЛРЬДй. |
|
| |
|
|
|
|
| |
| |
|
|
|